초대륙(超大陸, 영어: supercontinent)은 두 개 이상의 대륙괴로 이루어진 땅을 말한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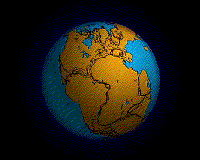
지금의 초대륙
편집
과거의 초대륙
편집
미래의 초대륙
편집
대륙은 현재도 이동을 계속하고 있고, 과거에는 주기적으로 초대륙이 형성되어 온 것에서부터 수억 년 후에는 다시 초대륙이 출현한다고 추측된다. 다만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.
- 아마시아
- 현재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, 오스트레일리아, 아메리카가 충돌해서 발생한다는 설.
- 판게아-울티마
- 아프리카가 유럽으로 오면서 같이 합쳐지면서 대서양이 다시 큰 바다가 되고 북아메리카 남부로 충돌해서 발생한다는 설.
외부 링크
편집